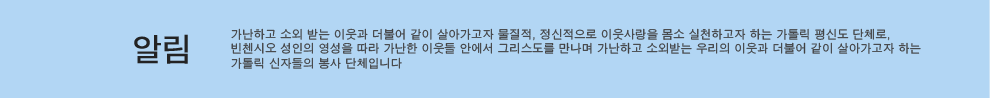마장동빈첸시오회:\"[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치매노모와 형 돌보는 이민수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테레사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1-01-07 15:14본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치매노모와 형 돌보는 이민수씨\"
어머니와 형만이라도 따뜻했으면...
▲ 방바닥과 벽지를 뜯으며 밥을 달라고 소리치는 윤 할머니. 벽지와 바닥이 성한 곳이 없다.
\"밥 줘, 밥 줘… 아침 먹고 아무 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밥 줘…\"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있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0의 7.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낡은 무허가 건물에서 윤음진(가명, 87) 할머니가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밥을 달라고 소리친다.
중증 치매환자인 윤 할머니는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밥 달라는 말을 주문 외듯 계속 내뱉는다. 두 눈의 시력도 모두 잃어 답답하다며 보채기도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방안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게다가 장판과 벽지를 뜯어내는 바람에 몇 차례나 도배를 했지만 소용이 없다.
할머니 방이 바라보이는 비좁은 거실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턱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 전체가 일그러지는 한 노인이 누워 있다. 윤 할머니 장남 이권수(가명, 63)씨다. 5살 때부터 뇌병변을 앓아온 그는 몸이 굳어지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형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화장실에 가고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못해요. 밥도 떠먹여 줘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처럼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동생 이민수(가명, 57)씨가 안쓰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눈만 껌뻑인다. 그는 \"어머니가 정신이 들 때마다 찾고, 형도 돌봐야 해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며 눈물을 글썽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파견된 노인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가량 병시중을 거들어주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도때도 없이 자신을 찾는 노모와 형을 뿌리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민수씨는 점점 뼛속을 파고도는 추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보일러에 들어갈 가스비부터가 걱정이다.
\"저와 아내는 괜찮으니 어머니와 형만이라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춥기까지 하면 불쌍해서 어떡해요.\"
다행히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이달부터 형 권수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두 환자 때문에 24시간 난방을 해야 하기에 가스비만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온다.
민수씨 부인이 청소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 대기에도 부족하다. 겨울만 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꼬마 때부터 할머니와 삼촌 병시중을 들어온 민수씨 외아들(고1)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서울 마장동본당 빈첸시오회 이종생(필립보) 회장은 \"요즘 뉴스를 보면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가족마저 내팽개치는 일이 다반사지만 민수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돌봐 귀감이 된다\"며 독자들의 사랑을 요청했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2010. 12. 19발행 [1097호]
어머니와 형만이라도 따뜻했으면...
▲ 방바닥과 벽지를 뜯으며 밥을 달라고 소리치는 윤 할머니. 벽지와 바닥이 성한 곳이 없다.
\"밥 줘, 밥 줘… 아침 먹고 아무 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밥 줘…\"
재개발로 헐릴 위기에 있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0의 7.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이 낡은 무허가 건물에서 윤음진(가명, 87) 할머니가 방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밥을 달라고 소리친다.
중증 치매환자인 윤 할머니는 방금 식사를 했는데도 밥 달라는 말을 주문 외듯 계속 내뱉는다. 두 눈의 시력도 모두 잃어 답답하다며 보채기도 한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방안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게다가 장판과 벽지를 뜯어내는 바람에 몇 차례나 도배를 했지만 소용이 없다.
할머니 방이 바라보이는 비좁은 거실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턱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 전체가 일그러지는 한 노인이 누워 있다. 윤 할머니 장남 이권수(가명, 63)씨다. 5살 때부터 뇌병변을 앓아온 그는 몸이 굳어지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형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화장실에 가고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것도 못해요. 밥도 떠먹여 줘야 하고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처럼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동생 이민수(가명, 57)씨가 안쓰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 채 눈만 껌뻑인다. 그는 \"어머니가 정신이 들 때마다 찾고, 형도 돌봐야 해서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며 눈물을 글썽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파견된 노인요양보호사가 하루 4시간가량 병시중을 거들어주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도때도 없이 자신을 찾는 노모와 형을 뿌리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민수씨는 점점 뼛속을 파고도는 추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우선 보일러에 들어갈 가스비부터가 걱정이다.
\"저와 아내는 괜찮으니 어머니와 형만이라도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춥기까지 하면 불쌍해서 어떡해요.\"
다행히 사회복지사 도움으로 이달부터 형 권수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두 환자 때문에 24시간 난방을 해야 하기에 가스비만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온다.
민수씨 부인이 청소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 대기에도 부족하다. 겨울만 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꼬마 때부터 할머니와 삼촌 병시중을 들어온 민수씨 외아들(고1)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서울 마장동본당 빈첸시오회 이종생(필립보) 회장은 \"요즘 뉴스를 보면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가족마저 내팽개치는 일이 다반사지만 민수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돌봐 귀감이 된다\"며 독자들의 사랑을 요청했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2010. 12. 19발행 [1097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