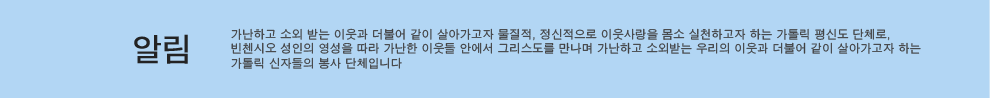평화신문 1313호 \"사랑이피어나는곳에\" 자양동빈첸시오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테레사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15-05-12 15:43본문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눈물로 아들 돌본 서난영 할머니의 30년 모정
정신질환 아들 돌보며 생활보조금과 파지 팔아 생계 이어
▲ 서난영(안나) 할머니의 꿈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서 할머니가 일을 하러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고 있다.
▨후견인 / 임용선(노엘)
서울대교구 자양동본당 사회사목분과장
서울대교구 자양동본당 빈첸시오회장, 8지구 빈첸시오회장
기역자로 허리가 굽은 채로 파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죽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에는 비닐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서난영(안나, 87) 할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집을 치울 시간이 없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의 손가락, 발가락은 휘어져 있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옆방에는 아들 최재영(야고보, 50)씨가 쥐죽은 듯 누워 있었다.
구순(九旬)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일을 한다. 아침 9시 30분부터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지를 모은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루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3000원이다.
아들은 좀처럼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30년째다. 50년 전, 바람난 남편과 헤어진 할머니는 서울 자양4동에 터를 잡고, 청과물 노점을 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한 학기도 안 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원인도 알 수 없었다.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들의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써봤다.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없이 굿판을 벌였다. 20여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은 ‘굿값’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아들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고, 세례를 받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아들은 거짓말처럼 이상한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서 할머니는 30여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고보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하고 기도를 바친다. 주일 미사도 거른 적이 없다. 하지만 아들은 늘 그 모습이었다. 서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서 할머니는 “내가 죽은 뒤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요양 시설도 생각해봤지만, 아들은 “가기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수양딸이 한 명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돌봐줄 여력이 없다.
딸은 “광주에 동생 방을 하나 구해주면 틈틈이 가서 돌보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사글셋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다.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파지를 팔아 마련한 돈을 합한 50여만 원이 전부다. 할머니의 작은 꿈은 딸 집 근처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살아갈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이다. 서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정신질환 아들 돌보며 생활보조금과 파지 팔아 생계 이어
▲ 서난영(안나) 할머니의 꿈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서 할머니가 일을 하러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서고 있다.
▨후견인 / 임용선(노엘)
서울대교구 자양동본당 사회사목분과장
서울대교구 자양동본당 빈첸시오회장, 8지구 빈첸시오회장
기역자로 허리가 굽은 채로 파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죽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할머니와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에는 비닐 봉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서난영(안나, 87) 할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집을 치울 시간이 없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의 손가락, 발가락은 휘어져 있었다.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옆방에는 아들 최재영(야고보, 50)씨가 쥐죽은 듯 누워 있었다.
구순(九旬)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일을 한다. 아침 9시 30분부터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지를 모은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루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3000원이다.
아들은 좀처럼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 30년째다. 50년 전, 바람난 남편과 헤어진 할머니는 서울 자양4동에 터를 잡고, 청과물 노점을 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한 학기도 안 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 원인도 알 수 없었다.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다. 아들의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써봤다.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없이 굿판을 벌였다. 20여 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은 ‘굿값’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아들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네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고, 세례를 받았다. 성당을 다니면서 아들은 거짓말처럼 이상한 행동을 멈췄다. 하지만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서 할머니는 30여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야고보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하고 기도를 바친다. 주일 미사도 거른 적이 없다. 하지만 아들은 늘 그 모습이었다. 서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서 할머니는 “내가 죽은 뒤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요양 시설도 생각해봤지만, 아들은 “가기 싫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수양딸이 한 명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돌봐줄 여력이 없다.
딸은 “광주에 동생 방을 하나 구해주면 틈틈이 가서 돌보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사글셋방 한 칸 얻을 돈이 없다. 한 달 수입은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금과 파지를 팔아 마련한 돈을 합한 50여만 원이 전부다. 할머니의 작은 꿈은 딸 집 근처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살아갈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이다. 서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